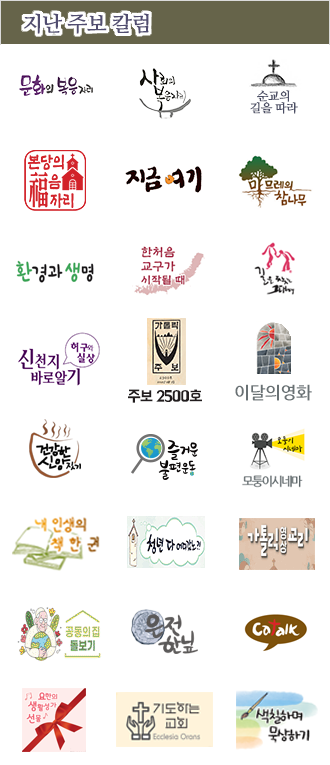가수 양희은의 콘서트 제목이 ‘느리게 걷기’라는 소리를 듣고는 참 그렇다 싶어 아주 느리게 길을 걸어보았다. 빨리 걷거나 뛰어야지만 운동이라도 된다 싶어 살아왔기에 그렇게 여유롭게 어기적거리며 걸어 본 기억이 거의 없는 듯 했다.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개미들의 행렬과 틈새의 작은 풀꽃도 마주 걸어오는 사람들의 표정들도 마치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처럼 하나씩 새겨들어 왔다.
만약에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많은 이들이 선택할 최적의 수단은 비행기일 것이다.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어서 그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행기를 선택했을 때 부산과 서울의 중간 지역들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좀더 빠르게 가야한다는 강박이 온통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만이 의미를 지닐 뿐 지나는 여정과 풍경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속도가 빠를수록 살아가는 과정 속 사물들은 그리고 그 사물들과의 접촉과 경험은 소멸된다. 공간은 비워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이 연결될 때 그 의미를 지닌다. 목적지만을 향해서 그저 내달리는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쉼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치지 않는 것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며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며, 그리하여 조금씩 조금씩 그들과 하나가 되어 가는 세상에 살고프다. 하느님께 가는 길도 오랜 시간 더 많은 것을 느끼며 그 사랑과 믿음을 쌓아 가고 싶다. 늘 거기 있는 산같이, 늘 올려보면 가득하게 있는 하늘같이, 늘 같은 맘으로 느리게 느리게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식을 시간조차 없지 않을까.
달리지 못하는 것은 패배의 다른 이름이고 게으르고 나약함의 상징인 사회에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3명 중에 한 명이 항상 시간에 쫓긴다고 느끼고, 10명 가운데 9명이 피곤을 호소한다.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은 “나는 바쁘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압축되어 있다. 치명적인 속도 숭배 문화이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느림은 시간에 떠밀리며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시계의 속도가 아니라 인간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걷는 듯한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닐까. 오히려 걸음을 멈춘 시간이 길수록 삶도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느리게 걷더라도 계속 걸어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너무 늦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