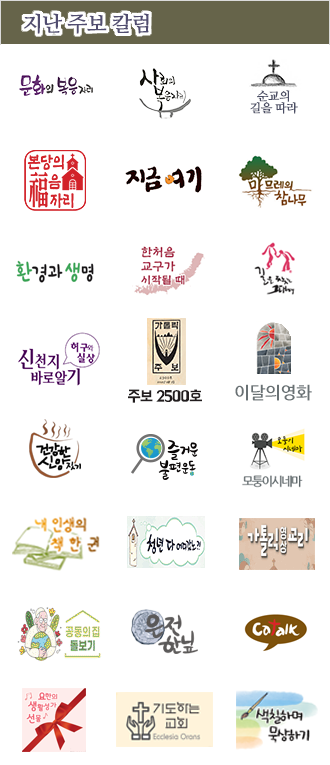교육과 종교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공유한다. 이때의 가르침은 대상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대상으로부터 끄집어 내는 것이기도 하며 대상이 가르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어떤 사회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가르침은 더 이상 진리로서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고 일종의 획일적인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만 작동될 뿐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은 어떤한 형태이던지 가르침의 습득이라는 직접적 결과보다는 이것을 바탕으로한 간접적 결과로서의 다양한 이익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즉 간접적 결과인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이익은 극단적인 하나의 결론으로 집결된다. 자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성공이다. 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이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고 나면 상관없다는 지극히 개인적 이익으로 점철된다. 그래서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라는 경제논리만이 이들에게 유일한 목표이자 가르침이다. 합리주의를 가장한 지극히 차가운 개인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지배할 따름이다.
종교는 으뜸가는 가르침이라는 동양적 어원과 신과 인간을 결합하고 연결한다는 서양적 어원이 있다. 이를 연결하면 신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종교는 신의 가르침은 고사하고 인간에게 화급한 질문조차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절박함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는 신의 가르침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성공의 축복을 기원하는 기복의 장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 역시 자본논리로 무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본논리의 지배하에 특히나 노동과 노동자는 죄의 대가이며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뒤진 경쟁력없는 무능한 자이다.그리고 이들은 교회내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다. 이들이 차별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심지어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못난 탓이고 그 못남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분리하여 인간 사회를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으로 구별한 고대의 반인권적, 반그리스도적 사회와 비교해도 우리 사회는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노예적 신분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따르는 우리 교회도 변했다고 볼 수 없다.
교육도 종교도 그 근원적 가르침을 상실하고 특정 지배논리의 도구가 되었다면 다시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