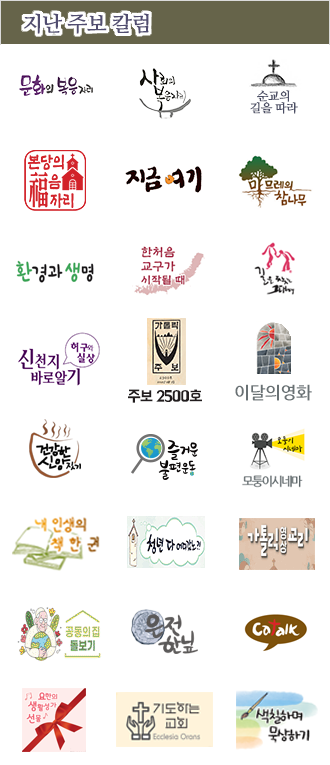| 호수 | 2352호 2015.11.01 |
|---|---|
| 글쓴이 | 김상진 요한 |
맛있는 성가 이야기
김상진 요한 / 언론인 daedan57@hanmail.net
학창시절 서로를 격려하며 친구로 지내던 남녀가 있었다. 남자는 신학교 입학→퇴학→재입학→자퇴→재입학 하는 등 어려움 끝에 신부가 되었다. 로마의 신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귀국한 신부는 수녀들에게 성가를 지도하기 위해 매주 한 차례 한 수녀원을 찾는다. 수녀원을 찾은 첫날 신부는 수녀가 되어 앉아 있는 학창시절의 여자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란다. 수녀도 기적 같은 만남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 성가 연습을 마칠 때쯤 수녀는 헤어질 때 부를 노래를 지어달라고 신부에게 부탁한다. 국어교사로 일하다가 늦게 수녀가 된 그녀에게는 주말이면 제자들이 찾아왔다. 한사코 말려도 찾아오는 제자들과 헤어질 때 부를 만한 노래가 없다는 것이다. 신부는 수녀에게 작사를 부탁했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녀가 됐다며 거절한다. 신부는 수녀원 수련장 수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작사를 명령한다. 순종을 생명으로 삼는 수도자이기에 수녀는 가사를 짓는다. 그 가사에 신부가 곡을 부쳐 탄생한 성가가‘석별’이다. 일명‘꽃비 단비’로 잘 알려져 있다.‘잘 가오 그∼대, 행복하시오. 축복의 노래로 그대 보내 오∼리다’로 시작하는 성가는 신부와 수녀를 새 임지로 보내는 환송미사나 장례미사 후에 많이 부른다. 작곡 이종철(베난시오) 신부, 작사 유승자(데레사) 수녀다. 작사자를 공개하지 말라는 유 수녀의 부탁을 지키느라 오랫동안 작사 미상으로 남아 있었다. 겉으로는 세속의 이별을 주제로 만든 노래지만 사실은 고귀한 이별을 담고 있다.
이처럼 성가 한곡 한곡마다 만들어진 배경과 이야기가 많다.
성 그레고리오 대 교황(590∼603)에 의해 정리된 그레고리오 성가는 서양음악의 시작이었다. 서양 오페라도 16세기 말 성 음악의 하나인 오라토리오에서 발전된 것이다. 바흐가 꽃 피웠던 대위법이라는 작곡법도 성가의 수평적 화성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가톨릭 성가는 세상의 어느 음악 장르보다 고귀하고 자랑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가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젊은이들은 유행가 선율에 가사만 바꾸어 미사 때 부르기도 한다. 성악을 전공한 성가대원은 화려한 멜로디로 우렁차게 부른다.
성가가 상업적, 세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성가는 단순한 멜로디와 화음으로 가사 전달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곡의도와 가사도 하느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느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침묵의 시간도 헤치지 않아야 한다.
성가 공부를 제대로 해 볼 참이다.‘해설과 이야기가 있는 성가 발표회’같은 게 열리는 곳이 없을까.
| 호수 | 제목 | 글쓴이 |
|---|---|---|
| 2905호 2025. 12. 28 | 하느님의 무기 | 조영만 신부 |
| 2903호 2025. 12. 21 |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 윤석인 로사 |
| 2902호 2025. 12. 14 | ‘자선’,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가르침 | 원성현 스테파노 |
| 2901호 2025. 12. 7 | “이주사목에 대한 교회적 관심을 새롭게” | 차광준 신부 |
| 2899호 2025. 11. 23 |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 이예은 그라시아 |
| 2897호 2025. 11. 9 | 2025년 부산교구 평신도의 날 행사에 초대합니다. | 추승학 베드로 |
| 2896호 2025. 11. 2 | 나를 돌아보게 한 눈빛 | 김경란 안나 |
| 2895호 2025. 10. 26 | 삶의 전환점에서 소중한 만남 | 김지수 프리실라 |
| 2893호 2025. 10. 12 |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 정성호 신부 |
| 2892호 2025. 10. 6 | 생손앓이 | 박선정 헬레나 |
| 2891호 2025. 10. 5 | 시련의 터널에서 희망으로! | 차재연 마리아 |
| 2890호 2025. 9. 28 | 사랑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 김동섭 바오로 |
| 2889호 2025. 9. 21 | 착한 이의 불행, 신앙의 대답 | 손숙경 프란치스카 로마나 |
| 2888호 2025. 9. 14 | 순교자의 십자가 | 우세민 윤일요한 |
| 2887호 2025. 9. 7 |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 권오성 아우구스티노 |
| 2886호 2025. 8. 31 | 희년과 축성 생활의 해 | 김길자 베네딕다 수녀 |
| 2885호 2025. 8. 24 |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 탁은수 베드로 |
| 2884호 2025. 8. 17 | ‘옛날 옛적에’ | 박신자 여호수아 수녀 |
| 2883호 2025. 8. 15 | 허리띠로 전하는 사랑의 증표 | 박시현 가브리엘라 |
| 2882호 2025. 8. 10 | 넘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기도 | 조규옥 데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