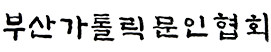마리안느와 마가렛
김양희 레지나 / 동대신성당, 수필가 supil99@hanmail.net
벌써 삼십여 년 전 일이다.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는 천지에 잎새들이 무성할 때였다. 고흥군도 해풍에 씻긴 수목들은 참기름을 바른 듯 반들반들 초록 윤기를 머금고 있어 그곳이 서러운 섬이라기보다는 그저 사슴이 뛰노는 아름다운 섬으로 비치기도 했다.
본당의 일행들이 소록도에 들어섰을 때 맞은편에서 녹음 가득한 오솔길 사이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다. 차창으로 벽안의 아름다운 두 여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스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신선했던 기억은 영화의 한 장면이 되어 오래도록 선명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
그 두 여인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었다. 소록도의 두 천사. 그들은 꽃다운 젊은 나이에 가장 비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동양의 작은 나라를 택했다. 매일 아침 병원을 돌며 한센인 환자들에게 따끈한 우유를 나눠주고 곪은 상처에 맨손으로 약을 발라주었으니 예수님을 대신한 사랑 그 자체였다.
1960년과 62년에 각각 한국 땅을 밟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의‘그리스도 왕시녀회’소속 재속회원으로서 종신서원까지 했으나 수녀 대신 간호사로서 봉사의 삶을 선택했다.
이십대에 소록도 땅을 찾아 이제 팔십대가 된 두 할머니. 낯선 나라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십 년 넘게 환자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사랑으로 보듬고는 2005년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훌쩍 떠나갔다. 그들의 방에 붙여놓은 서툰 한글로 쓴 좌우명은‘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자’였다.
드물게 순수하고 품위 있고 겸손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표창이나 시상식에도 결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이들의 봉사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를 설립 중이며 노벨평화상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방송을 위한 제작진들이 오스트리아 그들의 고향을 찾았으나 마리안느는‘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인터뷰를 거절했고, 마가렛은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더 이상 봉사의 삶이 어려워지자 남몰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두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품위 있는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두 천사의 숭고한 인생과 우정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최근에는 두 분의 이야기가 책과 영화로도 나오게 됐다. 이들의 삶이 사순절 기간에 작은 위안과 영감으로 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