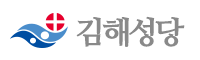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위령의 날 둘째 미사 강론
천주교 부산교구 김해성당 이균태 안드레아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 대한 기억과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은 그저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날이 오늘 위령의 날이다.
베네딕도 수도회에 그 기원을 두는 많은 수도회들 중에 1902년 전까지 가장 수도회칙이 엄격한 수도회가 시토회였다. 이 수도회는 1098년, 겨자소스로 아주 유명한 프랑스 중동부의 ‘디종’(Dijon)이라는 도시 근처에 있던 작은 마을 ‘시토’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수도회 이름도 시토회다. 그런데, 이 시토회의 수도규칙보다 더 엄격한 수도회가 있다. 1902년 교황 레오 13세 때에, 시토회에서 다시 분리 독립한 수도회인 트라피스트회다. 트라피스트회 수도자들은 아침 인사를 이렇게 한다: « Memento mori » 한국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말이다.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될 것임을, 무릇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그 생명이 다 하면, 결국 죽음을 맞게 될 것임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순간 움켜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하고, 쌓아 놓았던 모든 것을 남겨 둔 채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하나를 잊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직은 기력도 있고, 정신도 말짱하니, 죽음의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착각과 망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잠시 잊게 한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말, 지금 해야 할 것들을 미래의 것들로 죄다 미루어 버리게 한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저지당하지 않는 이상, 무한대로 펼쳐진다. 멈추지 않으면, 계속 나아가는 관성도 갖는다. 제어 당하지 않는 욕구와 욕망은 인간을 집어 삼키고, 마침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 되게 한다. 그리고 그 괴물은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겪는 고통을 몸소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는 ‘하느님의 자기 포기 혹은 자기 비움’을 두고 « 케노시스 »(kénose)라고 말을 하지만, 욕구와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남을 두고도, 천주교나 개신교나 모두 케노시스(kénose) 혹은 해방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교 입문식에 해당하는 것이 세례다. 세례를 받는 순간, 묵은 인간은 죽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로운 인간이 탄생한다. 욕구와 욕망이라는 먼지와 쓰레기를 덕지덕지 묻힌 몸이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 그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음 »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히게 되었으며, «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 (로마 6,3-4). 그렇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도 주님께서 겪으셨던 « 자기 비움 »을 겪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기 비움은 세례 때에 단 한번 이뤄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뤄내야 할 지상과업이다. 세례를 받았다고 다시는 욕구와 욕망의 노예상태로 빠져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람, 무죄 상태의 사람으로 돌려놓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다. 죄를 덜 짓고 살고, 욕구와 욕망에 덜 빠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죄보다는 선을 쌓기 위해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세례의 순간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가 바로 다름아닌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김해성당 형제, 자매 여러분,
엄률 시토회, 트라피스트회의 인사말, «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는 세례 때에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 죽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 있는 현실에 충실하라고, 욕구와 욕망의 굴레에 쉽게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일종의 경보장치처럼 여겨진다. 등잔에 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슬기로움을 닮아가는 길,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한 두 번은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 memento mori »라고 인사해봄은 어떠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