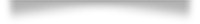저는 모라동에서만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네엔 저와 함께 학교생활을 했던 그 많은 동기나 선후배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듯 합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문득문득 지나다가 바라보는 옛시절의 흔적 중 한군데가 바로 현재 모라역사거리에서 차이나88 중국집이 있는 건물이 가리고 있는 뒷편에 위치한 아주 낡은 2층건물이 지날때마다 자주 눈에 밟힌답니다.

80년대 중반,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모라동은 타 지역에 비해 그때도 참 열악한 편이였지요. 거의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스레트지붕의 집들 안에 부엌하나 딸린 한칸 방에서 몇식구들이 함께 사는 세대들이 태반이였고, 그나마 마당이 있고, 방이 세칸이나 되는 저희집이 참 눈에 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폐교직전이라고 하는 모라초등학교는 제가 졸업할 때만해도 각 학년이 10반에서 12반정도 였으니 전교생이 2천명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근처 구포중, 모라여중, 덕포여중으로 진학했으니 80년대 중반은 정말 아이와 청소년으로 골목마다 공터마다 넘쳐났던 시절이였습니다.
당시에도 모라동엔 제법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때 반동기 중엔 꽤 많은 모라동친구들이 교회를 다녔고, 야간자율학습때마다 저녁 예배를 꼭 가야해서 자습을 빠져야 한다는 열렬(?)신자들과 감독선생님들의 실랑이가 매일 예사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신자인 제가 보기에도 그들의 신앙이 꽤나 진지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 어느날인가 교회를 다니던 뜻있는 동네 형들이 당시 모라동 동장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이유는 모라동사무소에서 운영하던 새마을회관 (현재 차이나타운 뒤편 그 건물)을 저녁마다 동네 청소년들에게 개방해달라는 것이였어요. 당시에 이 건물의 1층은 모라동 노인정이였고, 2층은 회의공간으로 약 30개정도의 교실처럼 책걸상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 공간은 매일 쓰는 것도 아니니 여기를 저녁마다 자신의 공부방이 따로 없는 동네 중고등학생들에게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빌려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였습니다. 물론 밤마다 전기를 쓰야하니 그 비용은 청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이였죠. 단, 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운영관리는 그 형들 그룹에서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냈던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당시 동장은 이들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당연히 허락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그 새마을 회관 2층은 밤마다 동네 학생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평일엔 늦게까지 학교서 야간자율학습을하고, 다시 늦은밤 여기로 와서 한두시간 더 공부를 하고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홀어머니가 일을 마칠만한 시간에 가서 포장마차 정리를 도와주던 형도 있었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근처 구포도서관이나 학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밤엔 여기에 와서 공부를 계속하는 형님, 누나들이 많았어요. 아마 동네 수재들은 다 여기서 만날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을 서로서로 가르쳐주고 받는 일도 흔했습니다. 매년 대입시험이 다가올수록 2층 공부방의 긴장감은 엄청 높아졌지요. 제 기억엔 매년 그기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등 좀 한다고 소문난 형들, 누나들은 다 합격했다는 소문을 듣고 기죽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틈틈이 그런 형들이랑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은 듯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는 그때 자기 진로를 고민하던 형들중에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싶다는 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나라 언어를 익혀서 이 후 중국이나 러시아로 선교활동을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목표로 하여 장차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꽤 성적이 좋은 형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의아했는데, 저도 막상 전주교에 입문을 하게 되니 그때 그 형들의 말이 지금에사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정말 그런 말을 한 형들이 과연 그걸 진짜 실천했는지는 모릅니다.
얼마전 어릴적 친구 부친상에 갔다가 그 친구의 두 살 위 형님을 몇십년만에 뵌적이 있었습니다. 친형이 없는 저에게 친구의 형이지만 늘 친동생처럼 대해 주셨지요. 그 형님도 그 새마을 회관의 유명한 멤버 중 한분이셨는데, 연세대를 입학하여, 졸업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지금 현재 통일부 대변인으로 지내십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재도 있는 모라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셨고, 그기서 만난 형수님과 결혼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두 딸과 신앙생활 중 이시더군요.
제가 천주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동생을 통해 아시고 계셨나봐요. 해서 대뜸 저한테 모라성당이 언제 생겼지? 라고 묻더군요. 2005년쯤 생겼다고 하니, 그 형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할 당시엔 동네에 성당이 없으니 오로지 교회가 다인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똑똑하셨던 그 형님마저 천주교와 뭐가 다른지 개념을 잡을 수 없어서 하느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오직 교회가 다 인줄만 아셨다고. 물론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낫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당마저 없는 열악한 동네에서 성장한 덕분에 접할 기회마저 없었다는 것을 웬지 아쉬워 하시더라구요. 저도 참 동감했습니다.
우리 모라성당이 한 20년만 빨리 생겼더라면, 지금은 볼품없는 허름한 2층건물 앞 공터에서 밤마다 자신들의 진로를 고민하던 청년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천주교 사제나 수도자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것이고, 성당 로비에 걸린 본당출신 사제얼굴이 담긴 액자의 숫자가 지금보다 휠씬 많았을 것이 분명하고, 궁극적으로 저 자신 또한 진로를 고민하며, 당당히 중국이나 러시아로 선교활동을 떠나겠다고 말한 그 형들 옆에서 저도 천주교 사제로서 제 인생을 하느님께 바치고 싶다는 덧(?)없는 말이라도 한번 하지 않았으려나 싶은 생각이, 오늘도 무심히 모라역 사거리를 지날때마다 들곤 합니다.






 2025년 농민주일 행사 (7월 20일)
2025년 농민주일 행사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