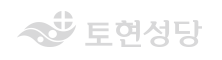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대축일 강론
오늘 우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대축일’을 이동하여 경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하여 오늘 강론은 우리나라의 박해 시기부터 존속해 왔던 교우촌에 대해서 묵상해 볼까 합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될 당시 조선은 충효 정신과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가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잇는 성리학적 질서의 핵심적 체계였습니다.
따라서 조상제사에 대한 거부나 부모, 임금보다 훨씬 높은 천주님께서 존재하시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계급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기반을 포기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은 향촌사회나 친척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회유를 피해 고향을 떠나 낮선 도시나 산간지방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1791년 신해박해로 알려진 진산사건으로 순교한 윤지충과 동생 윤지헌은 고향을 떠나 전라도 고산으로 이사하였으며, 충청도에 처음으로 신앙을 전파하였던 이존창도 가족의 박해를 못 이겨 같은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고산은 ‘되재공소’로 불리며 한국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우촌이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최양업 신부의 할아버지인 최인주가 고향을 떠나 충청도 청양군 다락골의 산골로 이주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우촌은 신해박해(1791)를 계기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
초기 교우촌은 지역적으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1801년 신유박해를 거치면서 박해를 피해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지역으로도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특히 1815년과 1827년 경상도에서 발생한 을해박해와 정해박해로 인해 교우촌은 경상도 남부까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또 그곳으로 유배되었던 이들의 선교활동과 맞물리면서 교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과 마산교구 내에서 형성된 교우촌을 살펴보면 언양, 밀양, 진주, 함안 양산, 동래, 통영 등지가 교우촌이 분포되어 있던 곳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신앙을 위해 세속을 피하여 살던 이곳 교우촌의 생활 모습은 어떠했는지, 프랑스 선교사 모방신부의 1836년자 서신을 통해 살펴봅시다.: “교우들은 늘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줄곧 숨어 살았습니다. ... 그들이 사는 곳을 외교인들이 탐지해 냈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는 데로 빨리 가진 것을 처분합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얼마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로 옮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옮겨 다닌 까닭으로 많은 교우들이 이미 거지 생활보다도 더 심한 곤궁 속에 빠졌습니다. 저는 추위가 영하 10도에서 12도나 되는 추운 한겨울에 거의 벌거벗은 신자 어린이들이 추위로 새파랗게 얼어 가고 비신자들의 집 문전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풀에서 뜯어온 산 풀뿌리와 맹물, 이것이 어떤 시기에는 우리 교우들 중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실제로 교우촌의 집들도 눈에 띨까 두려웠기에 대부분 바위 밑이나 으슥한 곳에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움막 정도가 다였습니다. 집을 짓더라도 주변 산간에서 베어낸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고 짚이나 억새로 이엉을 얹어 초가를 지었는데, 전라도에서는 그런 집을 도끼집이라 불렀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는 작은 손도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업을 위해 했던 일은 주로 척박한 산비탈이나 산골짜기에 살았기에 옹기를 굽거나, 담배 혹은 조를 심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촌의 구성원도 오늘날과 같은 가족 단위의 모습이 아니라 한 집에 한두 명씩 살아남은 사람들 혹은 체포되지 않고 간신히 탈출한 이들이 신앙으로 섞여 지냈기에 혈연 공동체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신자들끼리 결혼을 해야 했기에 서로 겹사돈을 맺는 경우도 많았으며, 같은 장소에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 왔기에 이러한 교우촌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은 뒤에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우촌들은 후에 공소가 되고 성당으로 승격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의 심장이요 성직자 수도자를 배출하는 성소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신앙의 뿌리를 유지하는 마치 일본에서 수백 년 동안 숨어 살아왔던 신자공동체 카쿠레 키리시탄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하겠습니다.(언양 가지산, 간헐산 일대 16개 공소 등)
‘은화’(隱花)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병의 신부가 1939-1950년까지 경향잡지에 기고한 순교소설의 제목인데, ‘박해시대의 신자들’을 상징하는 ‘숨은 꽃’이란 뜻입니다. 박해시대의 교우들이 그 극한 상황에서도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신앙을 증거하려는 교우들의 고뇌와 결의, 슬픔과 기쁨들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박해시대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 재산을 포기해야 했고 심지어 자신이 속한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의 관계를 모두 버려야 하는 어려운 길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의 복음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아멘.